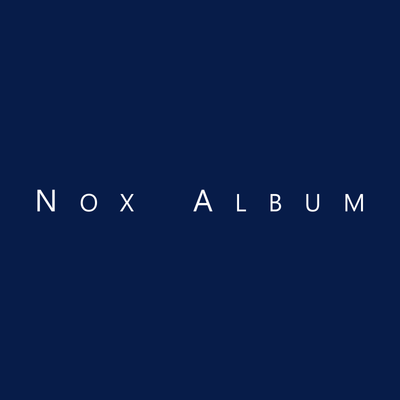사건이 아닌 사태를 표상함
우리가 표상하는 것이 하나의 사건이 될 수 없다. 모든 사건은 그것의 고유한 시간과 공간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사건을 우리가
질렸나
그래. 솔직히 말하자. 다 질렸다. 언제 이것을 깨달았을까. 오늘 아침, J가 나에게 “현타왔다는 소리구나”라고 했을 때일까. S가 “형은 공부
집과 직장의 중첩된 어딘가; 그 중첩을 떠나며
오늘도 자유교양으로부터 “굴림” 당해버렸다. 50주년 기념 문집에 실릴 기사를 내라고 해서, 끝까지 미루다 후다닥 만들어 버렸다. 퇴고따윈 하지 않고 제출해
논증 연습 (4): 의무와 양상의 상호 함축
1. 모든 의무가 실현된 세계를 가정하자.
2. 그러한 세계가 상상 가능하다.
3. (의무의 세계에 대한 접근가능성) 따라서 그러한 세계가 접근
개별자 종속적 보편자, 또는 거친 의미에서의 트롭
몇 년 전 어느 수업의 기말 페이퍼에서 나는 다음과 같이 논증했다. 거칠고 서툴지만, 여전히 나의 관심이 같은 곳에 있음을 보여준다.
어떤 회의주의
어떤 사건이 신성 체험을 야기한다. 그 사건을 두고 계시라고 부른다. (또는, 어떤 존재자가 신성을 예화하는 사건이 계시이며 그것이 신성 체험을
철학적 사적 언어
어떤 철학자의 말을 이해하기 위해 그가 사용하는 모든 단어를 그의 버전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통념이 있다. 예컨대 철학자 D가 말한 “개념”
자연종과 인공종
자연종과 인공종이 자연적으로 나뉜다는 믿음에 대한 불만이 있다. 그 경우 발생하는 형이상학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자연종을 포함하는 “자연적인 것의 모임”
“형식적 정의”
비평은, 철학은, 신학은, 대상 담론에 참여할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타당하다. 두 이유에서 그렇다.
첫째, 비평 일반은 어떤 대상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