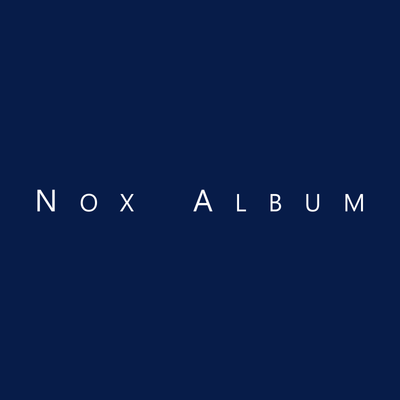자기고립적이지 않기 위하여
모든 운동에는 두 흐름이 형성되기 마련이다. 한쪽의 사람들은 공동체의 언어로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신념, 우리의 느낌을
유명론의 어떤 문제
갑자기 생각이 나서 남겨 둔다. 유명론의 주장을 “종이나 속성 등의 보편자는 오직 그것으로 불리우는 존재자의 집합일 뿐이다.”(이 주장은 외연주의
무엇-어떻게-왜
대학원 신입생 강독회를 위해 강독 도서인 지도교수의 대표작을 읽는다. 서문의 내용은 그가 여느 수업에서도 처음부터 깔고 들어가는 이야기와 동일하다. 분석철학을
양심 있게 쓰기의 어려움
자꾸 어렵다. 뭐가 어려운진 몰라도 확실히 뭔가 어렵다 ㅇㅅㅇ.. 일단 오늘의 어려움은 양심 있게 쓰고 말하는 법이다. 애기때부터 대학 와서까지
명료함 외의 어려움
명료함이 아니니까 ‘일상’ 카테고리에.
1. 공동체 S에서 일을 시작한다. 성탄절, 점심을 먹고 사람들과 인사 겸 카페에 갔다. 어쩌다보니 인스타를 발각당한다.
주석질
자기 말 하는 것과 남의 말을 소개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 나를 D철학에서 멀어지게 한 원인이었다. 정확히는, D철학에 으레 붙는 주석적
법칙
오랜만에 풍경 선생님의 블로그에 글이 자주 올라온다. 피드에 구독해 두었기에 매번 알 수 있다. 비트겐슈타인에 관한 글이 공유되어 오랜만에 <
인물 묘사
나는 허구를 모사할 때 인물의 말이나 행동은 가장 건조하게 그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옴표나 다양한 문장부호로 이루어진 표현은 그 인물이 어떤
단편; 러셀의 찻잔
차 끓이다가 문득 생각나서 쓰는 중이다. K는 칸트의 줄임말은 아니다. 딱히 나의 모습을 투영한 것도 아니다. 내 이야기를 써 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