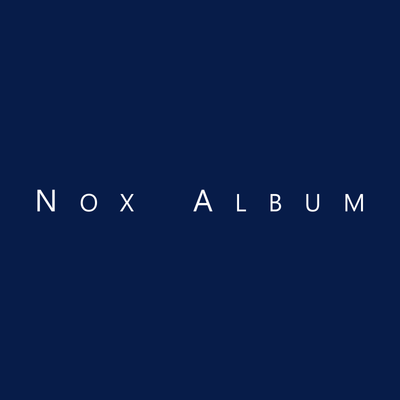DC Gallary
디씨인사이드 말고, 데이빗 챠머스. 챠머스의 홈페이지에 있는 갤러리(http://consc.net/pics/)에 들어가곤 한다. 처음 이 곳을 알게 된
그리스도교, 그리고 성서의 정체성
누군가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예수를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의 표지로 삼는다는 것이다. 정확히는, 예수라는 인물에 얽힌 어떤 고백들을,
"영미철학의 주요 문제"
Facebook 그룹, “Analytic Philosophy”에 공유된 영상. iai에서 진행한 티모시 윌리엄슨과의 인터뷰 중 일부이다. 윌리엄슨은 이시대 가장 걸출한 분석형이상학자 중
종교다원주의의 주제
“Religious pluralism, … denote[s] the acceptance and even encouragement of diversity or (and perhaps because of) the view that salvation/
코로나19 사태에 관한 단평
주장. 나는 세월호 사건이나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의 경우에서의 박근혜 정부의 책임과, 코로나19 사태에서의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상이하다고 생각한다. 반면,
예술에 있어 철학의 역할
누군가가 묻는다. 왜 대륙철학과 달리 분석철학의 작업은 예술적 영향력이 크지 않은가? 분석철학의 작업에 영향받은 예술가는 왜, 니체에게 영향받은 수많은 이들과
퍼트남과 칸트와 헤겔
모든 철학자들이 자신을 칸티안이라고 부르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그만큼이나, 자신을 헤겔리안이라고 부르는 것을 치욕으로 여기는 것도 사실이다.
퍼트남은 어떠한가? 그는
실재론
오랜만에 지평에 새로운 글을 올렸다: “추상적인 것에 관해 논쟁하기(링크)”. 내가 이 글을 통해 주장하려 했던 바는, 우리는 추상적 개념에
2019 겨울 이야기
최근 백야에 방문이 뜸했다. 인스타그램을 통해 논문 후기를 공유하기 시작했던 탓이다. (위젯을 하나 들여야겠다.) 또한 이곳에 옮길 만한 아이디어가 없기도
시를 쓰자면 마음으로
시를 쓰자면 마음으로 쓰지는 말자
마음으로는 어차피 쓰지 못 할 것 뿐이니
쓸 수 있는 것이거든 글이고 말 뿐이다
글로